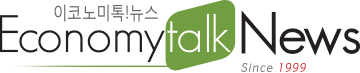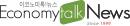[2013년 9월호]
[일본과 일본인 제1화]
수치심의 고집인가
敗戰(패전)을 終戰(종전)이라 기만
항복원점으로 돌아가 역사 찾으라

글/ 이원홍(전 한국일보 편집국장, 주일공사, KBS 사장, 문화공보부장관 역임)
지금 한일관계는 높은 파도에 떠밀리고 있다. 일의대수(一依帶水)의 해협이 심상치 않은 기상이다. 잘못하면 사공들이 난투전을 벌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사람 가운데 일본에 대해 일가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일본은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존재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그리고 인정적으로 관계가 깊다. 정치가 가는 방향과 사람들의 마음이 오가는 길이 동일하기는 어렵다. 복잡하고 험난하고 때로는 피부치보다 따뜻할 수도 있는 요사스러운 데가 있는 것이 일본과 일본인이다. 필자의 체험적 지식과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로 일본인의 깊은 곳을 탐색하여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소화천황 주재 어전회의
오늘이 8월 10일 ‘어전 회의’날, 전날인 9일 오후 11시50분부터 궁성에 있는 지하 방공호에서 소화천황(昭和天皇:平成天皇의 父皇)이 주재한 어전회의(御前會議)가 시작되어 10일 오전 2시 20분까지 2시간 30분간 계속되었다. 토의내용은 무조건항복을 요구하는 연합국의 포츠담선언 수락여부였다. 어전회의는 연합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원칙을 결정했지만 “천황의 국가통치 대권에 변경을 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양해 하에 이를 수락한다”는 조건을 첨부했다. 그리고 밤이 샌 11일 그러한 일본정부의 결정을 번즈 미 국무장관에게 통보했다.
당일에 되돌아온 번즈의 회답은 거리가 멀었다. 요약하면 이렇다.
“항복 후 일본국을 통치하는 천황과 일본정부의 권한은 연합국이 항복조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조치를 취하는 연합국최고지휘관(聯合國最高指揮官)에게 예속된다.…포츠담선언에 의한 일본정부의 최후적형태(最後的形態)는 일본국민이 자유롭게 표시하는 의지(意志)에 의해 수립된다.…연합국 군대는 포츠담선언이 규정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일본국내에 주둔한다.”
연합국은 항복대신 본토결전이라는 최악의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일본에 최종적인 공격을 가했다. 8월 6일 히로시마(廣島)에, 그리고 8월 9일 나가시키(長崎)에 사상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일본은 그 사실을 ‘신형폭탄 투하’라고 발표했다.
敗戰必至 항복上奏를 거부
8월 15일의 항복을 10일만 앞당겼더라도 사상초유의 재앙은 피할 수 있었다. 뒤에서 계속 설명하겠지만 일본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다. 연합국도 1944년부터 일본의 항복공작에 정력을 쏟았다. 일본 국내에도 항복의 기운이 태동하고 있었다.
그 파도를 탄 사람이 추축인물(樞軸人物)인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였다. 고노에는 기세등등한 군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천황에게 항복 상주문(上奏文)을 올렸다. 그때가 1945년 2월 14일이다. 원자탄 재앙이 떨어지기 6개월여 전이다. 역사적 유물이 되어버린 고노에 상주문(近衛上奏文) 3600자 중에서 핵심부분 몇 곳만 옮겨본다.
“유감스럽지만 패전(敗戰)은 이미 필지(必至)의 사실이 되었습니다.…국체호지(國體護持) 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패전(敗戰)에 뒤따라 올 수 있는 공산혁명(共産革命)입니다.…현재 연안(延安)에는 일본해방연맹(日本解放聯盟)이 조직되어 조선독립동맹(朝鮮獨立同盟)과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 대만선봉대(臺灣先鋒隊) 등과 연계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군부안의 혁신론(革新論)은 공산혁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변의 관료와 민간유지의 의식적인 공산혁명공작에 말려들 것입니다. 우익(右翼)이란 것은 국체(國體)의 옷을 빌려 입은(위장한) 공산주의자입니다”(日本外交年表 竝 主要文書 1840-1945. 下卷 608쪽, 外務省編)
전국민을 총받이로 옥쇄
고노에가 고립무원의 처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군부의 대세를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의 핵심이 천황이었고 전쟁목적이 국체보지(國體保持)라는 자존(自存)과 자위책(自衛策)을 내어걸었다는 데도 항복으로 맞서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6월 8일, 다시 어전회의(御前會議)가 열렸다. 소화천황(昭和天皇)으로서는 중일전쟁(中日戰爭) 이래 13회째 되는 어전회의였다. 그러나 고노에 상주문(上奏文)이 불발이 된 이후라 토의의 방향은 전쟁지도강화에 묶였다. 내각이 수즈키 간타로오(鈴木貫太郞) 총리로 교체되었지만 주전파가 압도적이었다. 어전회의는 파국을 부르는 “전쟁지도 기본대강(戰爭指導基本大綱)”을 의결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오키나와 전투처럼 전 국민을 옥쇄(玉碎)로 몰아넣는 내용이다. 일본열도를 사람의 총받이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전쟁계획이 아니라 죽음의 계획이었다. 그 핵심 부분을 점검해본다.
<방침>
칠생진충(七生盡忠:일곱 번 태어나더라도 충성을 다한다는 뜻)의 신념을 원력(源力)으로 하여 지리(地利)와 인화(人和)로써 전쟁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으로 국체(國體)를 호지(護持)하고 황토(皇土:日本本土)를 보위하여 정전(征戰)의 목적을 달성한다.
<요령>
1. 신속히 황토전장태세(皇土戰場態勢)를 강화하여 황군(皇軍:日本軍)의 주전력을 이에 집중할 것.<1의 하반과 2를 생략함>
3. 국내에서는 거국일치 황토결전(皇土決戰:本土決戰)에 즉응(卽應)할 수 있도록 국민전쟁(國民戰爭)의 본질에 따른 제반(諸般)의 태세를 정비할 것.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의용대(國民義勇隊)의 조직을 중추(中樞)로 하여 전 국민의 단결을 공화(鞏化)하며 전의(戰意)를 앙양하여 물적국력(物的國力)의 충실, 특히 식량의 확보와 특정병기(特定兵器)의 생산에 국가시책의 중점을 둔다. <4는 생략함>”(敗戰の記錄, 參謀本部所藏, 256-277쪽)
그리고 일본정부는 6월 23일 달력나이 15세 이상 60세까지의 남자와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여자로 국민의용전투대(國民義勇戰鬪隊)를 편성토록 하는 의용병역법(義勇兵役法)시행에 들어갔다.
‘민심이 나라를 떠나있다’ 천황에 보고
지난 6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송복(宋復)교수와 부인 하경희(河慶姬)여사의 ‘맹자(孟子)글귀전에 송교수가 맹자공손축하(孟子公孫丑下)의 명구를 전시했다. “孟子曰天時不如地利地利不如人和로 시작하여 地利不如人和也로 끝나는 대작이었다. 송교수가 첨부한 번역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 3리 밖에 안 되는 내성과 7리 밖에 안 되는 성을 포위해서 공격해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 포위 공격할 때는 하늘이 내린 시운을 택해서 했을 것임에도 이기지 못함은 천시가 지리만 못하기 때문이다.” 패망을 앞둔 어전회의가 이 맹자 글귀를 인용하여 전국민 옥쇄로 몰아넣는 전쟁지도기본대강을 의결했다.
그러나 천시(天時)도 지리(地利)도 인화(人和)도 일본 쪽을 편들지 않았다.
이날의 어전회의에서는 민심이 이미 나라를 떠나있다는 민심동향이 천황에게 보고되었다.
“국민의 마음에는 시국의 전환을 기구하는 기분이 있어 군부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심해지고 지도층에 대한 신뢰감이 동요되고 있으며 서민층과 농가(農家)에서는 문제를 제관(諦觀)하여 자기적풍조(自棄的風潮)에 빠져 있다. 그리고 지도적 지식층에는 초조와 화평을 기구하는 기분이 저류에 흐르고 있다.”
그런데도 추축인물(樞軸人物)들은 국민을 의용병으로 조직하여 ‘국민전쟁’을 감행하기로 했다. 국민전쟁이란 있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정체불명의 전쟁이다. 연합군의 총포탄에 국민을 총받이로 세우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군부는 이 총받이를 위해 구민의용대를 조직했다. 직장과 지역과 학교를 단위로 일본국민 중 적령자 전원을 군인으로 편성했다. 만약 본토결전이 전개되었다면 그 피해규모는 원자탄 재앙을 능가하였을 것이다.
피할 수 있었던 원자탄 재앙
일본에 양심세력이 있다면 원자탄의 재앙을 따지기 전에 6월 8일 어전회의의 전쟁범죄를 추궁하여 일본이 저질은 전쟁의 성격을 규명하고 거기에 관련된 전쟁범죄자의 영구소추(永久訴追)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원자탄 재앙의 1차적 책임은 전쟁지도자와 그들을 추종한 일본정부가 져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7월 26일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선언의 조기수락이 원자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다. 에누리해서 생각하더라도 이런 기회가 세 번은 있었다.
6월 22일, 전황을 알게 된 천황이 “전쟁종결(戰爭終決)을 위해 노려하라”고 최고전쟁지도자회의(最高戰爭指導者會議)에 지시했지만 이것도 허사로 돌아갔다. 일본정부는 그로부터 약 1개월 20일이 지난 8월 10일에야 포츠담선언(7월 26일)을 조건부 수락한다는 통지문을 연합국에 보냈다. 히로시마(廣島:8월 6일)와 나가사키(長崎:8월 9일)에 원자탄이 투하된 뒤였다.
천황(天皇)과 국체보지(國體保持)를 조건으로 첨부한 일본정부의 항복통지문을 수령한 연합국은 “천황의 권한은 연합국최고지휘관에게 예속되는 것이며 연합국군대는 포츠담선언이 규정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일본국내에 주둔한다”는 회신을 8월 11일 일본정부에 전했다.
히틀러가 항복하고 소련의 참전이 시작되는 전황이 위급해지자 천황은 8월 14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2시까지 궁중에서 다시 어전회의를 열고 무조건항복을 결정했다. 그리고 연이어 오후 2시40분 육군 간부들이 천황의 결정을 따르기로 서명을 결행하고 오후 3시 수상관저에서 열린 각의(閣議)가 무조건항복을 의결하고, 밤 11시 천황이 ‘종전조서(終戰詔書)’를 발포했다. 이에 따라 피랍도공의 후손으로 외상(外相)에 오른 도오고오 시게노리(東鄕茂德)가 그날(8월 14일) 밤 11시 포츠담선언의 모든 조항을 이의 없이 수락하는 무조건항복을 스위스 정부를 통해 연합국에 통보했다.
포츠담선언의 수락은 카이로선언의 수락을 포함한다. 포츠담선언 제8조가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라고 동일체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일본군국주의와 그 조언자를 영구히 제거
카이로선언은 “조선인민의 노예상태(奴隸狀態)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맹세코 조선을 자유독립시킬 결의를 갖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포츠담선언은 제6조에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영구히 제거하겠다는 청산약속을 공언했다.
“우리는 무책임한 군국주의(軍國主義)가 세상에서 구축될 때까지는 평화와 안전과 정의의 신질서(新秩序)는 존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바이므로 일본국민을 기만하여 이로 하여금 세계정복의 허영을 종용한 과오를 범하게 한 권력과 세력은 영구히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4조에서 “무분별한 타산으로 일본제국을 멸망의 함정에 빠지게 한 자의(恣意)한 군국주의적 조언자(助言者)에 의하여 일본국이 계속 통어(通御)될 것인가 또는 일본국이 이성(理性)의 경로를 밟을 것인가를 일본국 자신이 결정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고 하였다.(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랐음)
그리하여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의 무조건항복을 선언하는 천황의 떨리는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 “악자필망(惡者必亡)이다. 역사의 심판은 가차없이 내려졌다.
그리고 9월 2일 도쿄만(東京灣)에 계류 중인 미 군함 미주리호 함상에서 일본정부를 대표한 전권대표(全權代表) 외무대신 시게미츠 마모루(重光葵)와 군부를 대표한 참모총장(參謀總長) 윤군대장 우메즈 미치로오(梅津美治郞)가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조인이 끝났다.
정부와 군부의 대표가 서명으로 공약한 항복문서에도 “포츠담선언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 선언의 실시를 위해 연합국최고사령관 또는 기타 특정의 연합국 대표자가 요구하는 일체(一切)의 명령을 발하는 일체의 조치를 취할 것을 천황과 일본국정부 및 그 후계자를 위하여 약속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8월 30일에는 연합국군 최고사령관(聯合國軍最高司令官) 맥아더 원수가 진주하고 8월 28일부터 시작된 연합국군의 진주로 일본에 대한 연합국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기독교지도자와 애국지사 학살계획
여기서 진상의 규명을 기다리고 있는 통탄스러운 사건 하나를 들추어보고자 한다. 1945년 8월로 예정되었다는 일제의 조선인 기독교지도자와 애국지사의 학살계획에 관해서다. 고신대학교 부총장 이상규 박사의 한국교회사에 의하면 패전의 도래를 감지한 일본이 조선총독부 보호관찰령(保護觀察令)을 발동하여 1945년 8월 18일을 기해 다수의 조선인 기독교 지도자와 애국지사들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6월 8일 어전회의에서 의결된 본토결전(本土決戰) 대비책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일제의 학살음모였던 보호관찰령 제3호가 알려진 것은 해방 직전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주임이었던 최운하(崔雲霞)의 폭로에 의해서였다. 그는 일제시대 고등계형사 출신이었고 미군정하에서는 경무관으로 승진하여 서대문경찰서장을 지냈다. 이 음모는 사학자 문정창(文定昌)도 확인했다. 그는 이 내용을 자신의 ‘군국일본(軍國日本) 조선강점 36년사’ 하권에 기록해 두었다.…미국북장노회선교사 마포삼열(馬布三悅:Samuel H. Moffett)도 그의 저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The Christians of Korea)’에서 일제의 살인음모가 있었음을 말하고 이 음모가 후에 밝혀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선교사 방위량(William Blair) 또한 이 점에 언급했다. 방위량은 ‘미군이 필리핀을 함락시켰을 때 일본군 지도자들은 미국과 소련이 조선에 진주할 것을 예상하고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에게 협력할 것을 우려하여 1945년 8월 중순경 한국인 기독교 신자들을 학살하도록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Gold in Korea)’고 기록하고 있다.”
문정창의 저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있다.
“공포감에 사로잡힌 자들은 적(敵) 미군에 대한 위구심보다 조선인에 대한 공포심이 앞서 있었다. 일본군은 미군의 인천(仁川) 부산(釜山)의 상륙을 예상하였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1945년 늦은 봄부터 각지의 헌병대와 경찰서를 재촉하여 조선인 지사(志士)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범위는 이른바 보호단체 소속의 지사들을 제1급으로 하여 위험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는 회색적 친일분자도 들어있었다. 일본인들은 그러한 조선인 식자들은 미군이 상륙하면 반드시 미군에 부세(附勢)하여 일본인들을 크게 해(害)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한 그들은 그 소위 친일 아부분자들을 지사들과 함께 방공호로 위장한 살인굴(殺人窟)안에서 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시내 대상자들 중에는 소개자(疏開者)가 많았던 관계로 액난을 면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처형 직전에 해방을 맞아 대부분의 지사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기도 하였다. 살인굴의 소재지는 평안북도 영변군 영변읍 외산곡(寧邊郡寧邊邑外山谷)으로 알려졌다.”
당시의 조선총독은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였다. 내각의 수장을 지낸 육군대장출신이다. 패전 1년 전인 1944년에 제9대 조선총독에 부임한 것을 보면 본토결전의 지역책임자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학살은 국제법위반이다. 전쟁규칙에 있어서도 후방 비무장인원에 대한 학살은 위법이다. 이 엄청난 사실이 햇빛을 보지 못해 신음하고 있다.
수치는 천황에 대한 不忠
전후세계의 질서파괴는 침략과 전쟁의 책임에서 도피하며 천지의 정기(正氣)를 역행한 일본의 오만의 영향이 크다. 그 원천이 패자(敗者)임을 저버린 자기싱실(自己喪失)에 있다. 이로 인해 항복문서로 서약하고 조인한 패자(敗者)의 이행조건이 폐기되고 패전과 항복이라는 자기와 타자(他者)간의 상호관계가 변질되었다. ‘국화와 칼’의 저자 베네딕트는 “구미(歐美)에서는 죄(罪)의 내면적인 자각에 따라 선행(善行)이 행해지지만 일본에서는 수치(羞恥)라는 외면적인 강제력에 의해 선행이 행해진다”고 하였다. 베네딕트는 일본인이 타율적인 행동양식에 철저하다고 하였으나 타자(他者)와 대비되는 자기의 내면적인 규율이 상실되면 타율적인 행동은 모방과 위장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일본인은 자기의 정직 보다 타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한다. 패전은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인의 사회적가치관은 부끄러움이 타자(他者)와의 상호관계를 불리하게 한다는 인식으로 보편화되어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요체(要諦)를 이루는 것은 국가와 자기와의 관계이다. 일본인에게는 국가는 공동체가 아니다. 만세일계(萬世一系)로 상징되는 천황과의 적자(赤子)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봉건적(封建的)이라기보다 신화적(神話的)인 관계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런 관계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수치심(羞恥心), 즉 부끄러움은 천황에 대한 불경(不敬)이자 불충(不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일본은 패자(敗者)의 스테이터스를 패전(敗戰)이 아닌 종전(終戰)으로 수용했다. 정직하게 말하면 패전을 종전으로 기만(欺瞞)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이 6ㆍ25의 정전(停戰)을 전승일(戰勝日)로 기만한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한 때, 항복(降伏)의 <伏>자를 <服>자로 바꾸어 항복(降服)이라 써왔다. 개<犬>자가 그렇게도 싫었던 모양이다. 중국어도 <降伏>과 <降服>을 병용하지만 <降伏>을 주로 사용한다. 설문(說文)에는 <伏>자를 “개(犬)가 엎드려 사람의 의향을 묻는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항복(降伏)을 승리자 앞에 개(犬)처럼 엎드려 애걸하다는 뜻으로 이해한 것 같다.
敗戰은 민주주의와 평화와 번영의 起源
패전(敗戰)과 종전(終戰)은 다르다. “다르다”가 아니라 종전(終戰)은 패전(敗戰)이 아니다. 일본의 패전(敗戰)은 무조건항복(無條件降伏)의 결과다. 이와나미 국어사전(岩波國語辭典)도 종전을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 하고, 패전(敗戰)을 “전쟁(戰爭) 전투(戰鬪)에 패배하는 것”아라 분간했다.
법률적인 절차로 말하자면 천황이 항복과 전쟁중지를 선언한 8월 15일 종전(終戰)이 이루어져 9월 12일 항복문서 조인이 끝남으로써 패전(敗戰)이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그 날을 항복의 기준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일본이 68년간 종전을 고집해온 것은 기만(欺瞞)이다. 일본은 항복으로 전쟁을 종전했다. 종전이 항복을 대신할 수 없다. 일본은 종전국(終戰國)이 아니라 패전국(敗戰國)이다. 종전(終戰)을 고집하는 것은 항복(降伏)을 부인하는 것이다. 일본의 8월 15일은 종전기념일이 아니다. 항복기념일(降伏記念日)이거나 패전기념일(敗戰記念日)이다.
일본은 민주주의도, 평화도, 평화헌법도, 번영도, 국민의 행복도 모두 패전(敗戰)이 원천이다. 패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일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백지로 돌아간다. 무(無)로 돌아간다. 패전(敗戰)의 부인(否認)은 그것을 원천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평화와 평화헌법과 번영과 국민행복을 부인하는 것이다.
경제력으로 지탱된 敗戰의 기만 지난 8월 6일자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석간(夕刊)에 게재된 “명예로운 패배, 씻을 수 없는 수치(恥)와 함께”라는 개인칼럼(池澤夏樹)을 읽었다. 40만부의 베스트셀러라는 어떤 서책을 인용하며 “일본인은 패전(敗戰)은 없던 것으로 하고 종전(終戰)만으로 역사를 만들어왔다고 한다. 강한 미국에는 그저 일념으로 복종하고 약한 한국과 북한에는 강기(强氣)로 밀어붙였다. 그 자세를 경제력(經濟力)으로 지탱해 왔다. 경제력의 지탱을 잃어버린 지금에 와서 겨우 사태를 직시하게 되었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말미에서 “지금부터 닥쳐오게 될 쇠퇴 속에서 명예로운 패배(敗北)를 인정하게 될 수 있을까. 아베정권(安倍政權)의 거동과 선거결과를 보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기만(欺瞞)에 너무도 잘 길들어졌다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일본은 민주주의 개념에 흥미도 없었다 에드윈 라이샤워는 “일본인의 정치적 전통(政治的傳統)에는 개념으로서나 관행으로서나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했다. 라이샤워(Edwin Oldfather Reischauer)는 선교사의 아들로 토쿄(東京)에서 출생하여 하버드 교수로 재임한 뒤 한일회담이 고비에서 타결로 달리고 있던 1961년부터 1966년까지 주일대사를 역임한 대표적인 지일파(知日派)학자다. 그의 대저(大著) ‘일본인(The Japanese)’은 일본인 부인(松方ハル)의 내조도 있었겠지만 대단한 저술이다.
일본은 타력 민주화, 한국은 자력 민주화
일본 우익(右翼)의 반한(反韓)은 한국의 발전력으로 작용한다.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한국인이다. 양지에서 음지에서 일본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아직 일제 식민지체험 1세대가 생존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무슨 논리를 동원하여 침략(侵略)을 부인해도 역사의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 위안부문제에 세계의 양심이 들끓어도 수치를 가리는데 열중하고 있지만 진실 앞에 굴복하는 날이 조만간 오게 될 것이다. 야스구니ㆍ신사(靖國神社)참배를 “평화를 맹세하는 기도”라고 변명하지만 그곳은 ‘군국(軍國)의 신역(神域)’이며 ‘국체(國體)의 칼트’임을 세계가 알고 있다. 개헌이 사명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헌법 9조가 일본 번영의 모태이다.
라이샤워는 일본의 민주주의 전통에 관한 설명으로 “19세기 중엽의 일본인은 민주적인 제도를 창출해 보겠다는 의욕조차 없었고, 20세기 신흥국 같지 않게 민주주의 개념에 흥미조차 가지지 안했을 뿐 아니라 민주적 제도를 만들어 보려는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에게 긴급했던 것은 하루라도 빠르게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 이었다”고 설명했다.
1871년 12월 23일부터 73년 9월 13일까지 약 2년간에 걸쳐 구미 12개국을 시찰한 이와쿠라ㆍ견외사절(岩倉遣外使節)의 시찰보고서를 보면 라이샤워 교수의 지적을 실감하게 된다. 정치적 이념의 발전이나 민주적 제도의 실태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명치유신(明治維新)으로 설립된 천황(天皇)의 새 정부를 강(强)하고 부(富)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데 열중했다. 프랑스혁명(1789년) 이후에 대두된 인권사상이나 미국과 영국의 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었다. 강하고 부한 나라의 외모에 정신을 팔았을 뿐, 유럽을 부흥시키고 미국을 강대하게 만들고 있는 원동력이 민주주의임을 감지하지 못했다.
사절단 보다 40년 먼저 1831년 미국의 형무소제도시찰을 위해 뉴욕에 도착한 프랑스의 정치학자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라는 불후(不朽)의 명저를 남겼다. 도크빌은 그 책머리 첫 줄에 다음과 같은 소감을 밝혔다.
“내가 미국 체재 중에 주목한 새로운 것들 가운데 지위의 평등만큼 나의 관심을 끈 것이 없었다. 지위의 평등이라는 기본적 사실이 사회발전과정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나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시찰단은 비엔나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를 구경하고 “프랑스혁명 이후 국가가 입헌체(立憲體)로 변했으며 유럽문화의 정화(精華)로 이루어진 공예(工藝)가 국가의 이원(利源)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에 기록했다. 사절단의 안목은 입헌군주제의 실태와 국가의 재원이 된다는 공예품의 실태를 관찰하는 정도였다. 그것이 명치국가의 기초가 되어 제국주의로 달려가는 군국주의 국가의 모델이 되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등 사절단의 수뇌들은 조선침략에 두뇌를 모아 정한론(征韓論)을 제창하며 운양호(雲揚號)사건을 꾸몄다.
이후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선언할 때까지 유례없이 견고한 독제체제를 이어갔다. 맥아더의 통치로 비로소 민주주의를 습득하기 시작했다. 항복이 없었으면 우리의 해방도 요원했겠지만 일본의 민주화도 요원했을 것이다.
우리와 일본은 민주주의 출발점이 동일하다. 일본은 미국의 점령통치에서 타력으로 민주주의를 습득했지만 한국은 자력으로 사상유례 없는 공산당 독재와 싸우면서 민주화를 성취했다. 일본이 타력이라면 우리는 자력이었다. 일본이 지식으로 배웠다면 우리는 실제로 배웠다. 일본이 평화적성취라면 우리는 전투적성취를 이루었다. 이것이 일본과 한국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베(安倍晋三)총리에 이르러 민주주의 교습시대를 비판하며 그 시대를 탈출하자는 ‘레짐첸지’를 들고 나섰다. 이 모두가 항복(降伏)을 부인하고 패전(敗戰)을 종전(終戰)이라고 기만한 것이 원점이다. 한일문제와 동(東)아시아의 지역갈등도 그것이 원인이다. 일본의 군국화경향에 세계가 우려하게 된 것도 그 기만이 원점이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