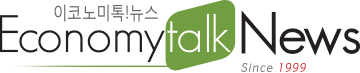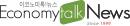인구 6천만 육박… 곧 유럽 최대국
‘위대한 아이 낳아 달라’
프랑스 200년 출산장려
인구 6천만 육박… 곧 유럽 최대국

글/趙泓來(조홍래) 편집위원(언론인)
위대한 프랑스를 위해 아이를 낳아달라고 호소한 드골 대통령의 특별 기자회견은 유명하다. 30년 전 지스카르 데스텡 대통령은 “프랑스를 위해 3번째 아이”(un troisieme enfant pour la France)를 호소했다. 프랑스 여성들이 마침내 호응했다. 2006년 프랑스의 출산율은 유럽 최고를 기록했다.
가임여성 1인의 평균 출산은 2명을 넘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1.4명, 새로 유렵연합(EU)에 가입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체코, 폴란드의 1.3명보다 높고 EU의 평균 출산율 1.5명을 크게 상회한다. 한국의 출산율 1.08명의 두 배다.
1940년 4천만 명 선까지 내려갔던 프랑스 인구는 6천만 명까지 육박했고 이대로 가면 유럽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독일의 8천 200만 명을 따라잡을지 모른다. 러시아에서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몇 백 년 후에는 국가가 소멸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긴 휴가 덕에 출산했다
한때 모든 면에서 남성과의 평등을 주장하며 출산을 거부했던 프랑스 여성들이 왜 태도를 바꾸었을까. 저명한 칼럼니스트 윌리엄 파프는 “긴 휴가 때문”이라는 이색적인 진단을 내렸다. 아이를 낳는 여성들은 대부분이 30대의 취업여성들이고 고학력 여성들이 출산에 더 적극적이다.
이들에게는 3년의 출산 및 육아 휴가가 주어진다. 이들은 휴가가 너무 길어 딱히 다른 소일거리가 없어 아이나 낳게 된다는 것이다. 긴 휴가의 무료함을 출산으로 달랬다는 이야기는 조금은 엉뚱하다. 더구나 독신주의와 동성애가 유난스러운 프랑스에서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게 의아스럽다.
여성들은 결혼이 주는 속박을 피해 독신의 자유를 만끽한다. 출산은 증가하지만 결혼은 감소한다. 1972년 41만 명이었던 결혼건수는 작년 26만 건으로 절반 넘어 줄었다. 결혼은 줄어드는데 아이는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혼외정사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내연부부는 지난 6년간 6만 명으로 늘었다. 자유를 사랑하는 프랑스의 독특한 문화가 엿보인다.
200년의 출산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200년에 걸친 출산장려 정책(natalist policy) 덕분이다. 정부는 GDP의 3%를 출산장려에 쏟아 부으면서 출산 애국주의를 자극했다. 아이도 낳고 돈도 벌고 애국도 하자는 캠페인이 주효했다. 취업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특별 수당을 주고 휴가를 단축하면 또 보너스를 준다. 아이의 수에 비례하여 각종 혜택도 늘어난다.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출생의 배경을 묻지 않는 관대한 정책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한 마디로 국가가 아이를 사랑으로 포용하니까 여성들도 출산으로 나라에 보답한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1호(2007년 3월호) 기사입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